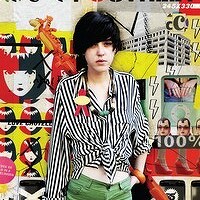“세속에 대한 흥미가 강렬하면 바쁘기를 구하지 않더라도 바쁨이 절로 이르고, 세속을 향한 흥취가 담담하면 한가하기를 힘쓰지 않아도 한가함이 절로 이른다.” 명나라 사람 육소형陸紹珩의 말이다. 돌아본다. 오늘 한가함을 갈망하면서도 늘 시간에 쫓기듯 사는 것은 세속에 대한 흥미가 강렬하기 때문인가? 조금 억울하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청받은 일을 거부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 일이 많아졌다. 바쁜 내색을 하며 주위 사람들을 고문하지는 않지만, 나의 핼쑥한 낯빛을 보며 사람들은 일을 줄이라 권고한다. 어떤 결락의 징후를 감지했기 때문이리라.
한자로 분주하다는 뜻의 忙망과 잊는다는 뜻의 忘망은 위치만 바뀌었을 뿐 마음 心심과 망할 亡망이라는 구성요소는 똑같다. 분주하면 잊게 마련이라는 뜻일까? 그 잊음이 사소한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것이 삶의 근본이라면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일정표를 보며 한숨을 내쉴 때가 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아뜩해진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호메로스가 들려주는 기묘한 이야기이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인 이타카를 향해 가던 오디세우스 일행은 마녀 키르케의 섬에 당도한다. 정찰을 나갔던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그 섬의 주인인 키르케가 건네주는 약초 즙을 받아 마시는 순간 돼지로 변신한다. 갑자기 몸에서 털이 돋아나고 허리가 구부러져 손이 바닥에 닿고 입이 앞으로 튀어나왔던 것이다. 당혹과 두려움을 느끼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돼지의 꿀꿀거림이었다. 변신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돼지의 몸에 돼지의 목청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은 멀쩡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기묘한 어긋남은 모든 인간 실존이 처해 있는 한계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한계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둘이다. 하나는 자신이 인간이었다는 기억을 털어버리고 돼지로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더라도 인간으로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자기 불화를 직시한다는 것은 늘 힘겨운 일이기에 사람들은 일쑤 망각의 강물에 자신을 던지곤 한다. 망각의 기법은 단순하다. 탐닉할 것들을 만드는 것이다. 현대 문명은 자기 응시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친절하게도 탐닉할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것이 외적 대상물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감일 수도 있다. 문제는 뭔가에 탐닉하면서도 내면에 깃드는 공허함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메로스가 던지는 질문은 형태는 다르지만 성경의 첫 대목에도 나온다. 히브리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선언한다. 그 표현을 두고 다양한 신학적·역사적·정치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구는 인간에 대한 본질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실존적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타자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사람들을 모욕하고 학대하고 억누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문제는 더욱 심오해진다. 인간의 인간 됨은 이웃과 관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을‘ 보냄을 받은자’라고 했다. 그의 말과 실천은 모두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은 보내신 분에게 돌아감이었고, 소명을 이룬 자의 홀가분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인을 가리켜‘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라고 말한 이가 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 오긴 왔는데 왜 왔는지는 모른다. 우리 삶이 가리산지리산 정처 없고 부평초처럼 부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 가지 색이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가 귀를 어둡게 한다. 온갖 맛이 맛을 잃게 하고, 사냥질에 뛰어다니는 것이 사람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힘든 보화가 사람의 행실을 어지럽게 한다.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한 현인의 말이 어쩜 이리도 인간 현실에 적확하게 들어맞는지 모르겠다. 그 온갖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사는지도 모른다. 생명의 원천과 깊은 통교를 잃어버린 삶은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다. 달팽이는 체액이 마르지 않는 한 자꾸만 벽을 타고 오르다가 결국에는 꼭대기에 이르러 말라 죽는다지 않던가? 욕망은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욕망의 주체를 태워 죽이고 만다. 욕망의 터 위에 세운 실존의 기본 정조는 불안과 헛헛함이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 없고 채울 수 없다.
바울의 말을 숙연하게 경청한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모든 때가 깨어야 할 때이다. 창문을 열어 후텁지근해진 공기를 환기하고, 어지럽게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개고, 찬 물에 얼굴을 씻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조용히 앉아야 할 때다.
해야 할 일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려는 마음을 잠시 거두고‘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내게 품부된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덧정 없이 스산하기만 한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마음의 주인이신 분께 자꾸 가져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줄이고, 마디 없는 시간에 마디를 만들어야 한다. 자아를 내려놓고 해야 할 많은 일에서 자신을 단절할 때 비로소 삶의 다른 차원에 눈이 뜨인다. 삶의 다른 차원에 접속할 때 중력처럼 우리를 잡아당기던 욕망은 줄어든다.
자신의 열정과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지금’이야말로 은총의 순간임을 알게 된다. 고단한 삶에 지쳐 생명이기적임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타락이 아니겠는가? 이미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데, 할 일이 많다고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죄가 아니겠는가? 내면에 신령한 새싹이 움트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구상 시인은 그것을“ 어둠으로 감싸여 있던 만물들이/저마다 총총한 별이 되어 반짝이고/그물코처럼 엉키고 설킨 사리事理들이/타래 실처럼 술술 풀린다”고 표현했다.
가끔 무슬림들이 길거리에 엎드려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본다. 종교의 차이를 넘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들은 엎드림이야말로 인간 됨의 본질임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 앞에 엎드려 있는가? 깨어 있는 삶이란 마땅히 엎드려야 할 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엎드릴 수 있어야 솟구쳐 일어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김기석|목사. 목회자이자 문학평론가. 감리교 신학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97년부터 청파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성경에서 길을 찾고, 고전과 문학에서 삶을 되짚는다.
한자로 분주하다는 뜻의 忙망과 잊는다는 뜻의 忘망은 위치만 바뀌었을 뿐 마음 心심과 망할 亡망이라는 구성요소는 똑같다. 분주하면 잊게 마련이라는 뜻일까? 그 잊음이 사소한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것이 삶의 근본이라면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일정표를 보며 한숨을 내쉴 때가 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아뜩해진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호메로스가 들려주는 기묘한 이야기이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인 이타카를 향해 가던 오디세우스 일행은 마녀 키르케의 섬에 당도한다. 정찰을 나갔던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그 섬의 주인인 키르케가 건네주는 약초 즙을 받아 마시는 순간 돼지로 변신한다. 갑자기 몸에서 털이 돋아나고 허리가 구부러져 손이 바닥에 닿고 입이 앞으로 튀어나왔던 것이다. 당혹과 두려움을 느끼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돼지의 꿀꿀거림이었다. 변신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돼지의 몸에 돼지의 목청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은 멀쩡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기묘한 어긋남은 모든 인간 실존이 처해 있는 한계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한계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둘이다. 하나는 자신이 인간이었다는 기억을 털어버리고 돼지로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더라도 인간으로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자기 불화를 직시한다는 것은 늘 힘겨운 일이기에 사람들은 일쑤 망각의 강물에 자신을 던지곤 한다. 망각의 기법은 단순하다. 탐닉할 것들을 만드는 것이다. 현대 문명은 자기 응시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친절하게도 탐닉할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것이 외적 대상물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감일 수도 있다. 문제는 뭔가에 탐닉하면서도 내면에 깃드는 공허함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메로스가 던지는 질문은 형태는 다르지만 성경의 첫 대목에도 나온다. 히브리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선언한다. 그 표현을 두고 다양한 신학적·역사적·정치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구는 인간에 대한 본질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실존적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타자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사람들을 모욕하고 학대하고 억누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문제는 더욱 심오해진다. 인간의 인간 됨은 이웃과 관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을‘ 보냄을 받은자’라고 했다. 그의 말과 실천은 모두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은 보내신 분에게 돌아감이었고, 소명을 이룬 자의 홀가분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인을 가리켜‘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라고 말한 이가 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 오긴 왔는데 왜 왔는지는 모른다. 우리 삶이 가리산지리산 정처 없고 부평초처럼 부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 가지 색이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가 귀를 어둡게 한다. 온갖 맛이 맛을 잃게 하고, 사냥질에 뛰어다니는 것이 사람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힘든 보화가 사람의 행실을 어지럽게 한다.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한 현인의 말이 어쩜 이리도 인간 현실에 적확하게 들어맞는지 모르겠다. 그 온갖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사는지도 모른다. 생명의 원천과 깊은 통교를 잃어버린 삶은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다. 달팽이는 체액이 마르지 않는 한 자꾸만 벽을 타고 오르다가 결국에는 꼭대기에 이르러 말라 죽는다지 않던가? 욕망은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욕망의 주체를 태워 죽이고 만다. 욕망의 터 위에 세운 실존의 기본 정조는 불안과 헛헛함이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 없고 채울 수 없다.
바울의 말을 숙연하게 경청한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모든 때가 깨어야 할 때이다. 창문을 열어 후텁지근해진 공기를 환기하고, 어지럽게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개고, 찬 물에 얼굴을 씻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조용히 앉아야 할 때다.
해야 할 일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려는 마음을 잠시 거두고‘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내게 품부된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덧정 없이 스산하기만 한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마음의 주인이신 분께 자꾸 가져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줄이고, 마디 없는 시간에 마디를 만들어야 한다. 자아를 내려놓고 해야 할 많은 일에서 자신을 단절할 때 비로소 삶의 다른 차원에 눈이 뜨인다. 삶의 다른 차원에 접속할 때 중력처럼 우리를 잡아당기던 욕망은 줄어든다.
자신의 열정과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지금’이야말로 은총의 순간임을 알게 된다. 고단한 삶에 지쳐 생명이기적임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타락이 아니겠는가? 이미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데, 할 일이 많다고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죄가 아니겠는가? 내면에 신령한 새싹이 움트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구상 시인은 그것을“ 어둠으로 감싸여 있던 만물들이/저마다 총총한 별이 되어 반짝이고/그물코처럼 엉키고 설킨 사리事理들이/타래 실처럼 술술 풀린다”고 표현했다.
가끔 무슬림들이 길거리에 엎드려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본다. 종교의 차이를 넘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들은 엎드림이야말로 인간 됨의 본질임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 앞에 엎드려 있는가? 깨어 있는 삶이란 마땅히 엎드려야 할 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엎드릴 수 있어야 솟구쳐 일어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김기석|목사. 목회자이자 문학평론가. 감리교 신학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97년부터 청파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성경에서 길을 찾고, 고전과 문학에서 삶을 되짚는다.
'SPECIAL > 2011 11-12 오늘, 깨어 있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늘, 깨어 있음 6│감사로 채우는 일주일 (0) | 2011.12.12 |
|---|---|
| 오늘, 깨어 있음 5│깨어 있는 삶을 기록하기 - 선한목자교회의 ‘영성일기’ (0) | 2011.12.05 |
| 오늘, 깨어 있음 4│내 마음, 내 감정에 깨어 있기 (0) | 2011.11.28 |
| 오늘, 깨어 있음 3│명랑한 세상을 꿈꾸다 - 아티스트 275c (0) | 2011.11.21 |
| 오늘, 깨어 있음 2│내 속에 살아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지요 - 연극 <빈방 있습니까?>의 덕구, 박재련 장로 (0) | 2011.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