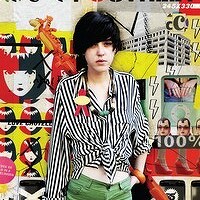마음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속마음’이라고 하지요. 아마도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느 정도 통할 것 같네요. 왜 내 마음속엔 나 자신조차 모르는 속마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글 이호은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해야 한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은 우주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주도 품을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란 게 우주만큼 광대한 크기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나의 마음이건 남의 마음이건, 마음을 안다는 일이 몹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진실도 깨닫습니다. 우직한 농부 전우익 선생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해야 한다고. 아차! 그러고 보니, 그동안 마음을 보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벙덤벙 덤비다 엉망진창 되었던 적이 그래서 많은 것이겠고요. 이제라도 어렵다는 것을 염두하며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농부는 자연에 사는 사람이고, 시인은 자연이 되는 사람입니다. 시인과 농부는 도시에서 자신의 마음을 찾겠다고 자기 자신만 챙기는 도시인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보고 싶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돌보고 싶다면, 먼저 자연을 담으라고. 그리고 자연을 닮으라고
“올 봄에 돌가지 씨를 뿌리며 깨달았습니다. 씨는 작아야 뿌리기도 묻기도 간수하기도 쉽겠다고. 그래서 씨는 이렇게 작게 생겨났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씨가 좀 굵은 율무, 콩, 땅콩은 심어놓으면 짐승들이 파먹기도 하는데, 작은 씨는 짐승들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눈에 띄지않는데 어떻게 건드릴 수 있어요? 낙락장송으로 자라는 솔 씨는 쌀의 오분의 일이 될까 말까하고, 몇 백 년을 살고 아름드리로 크는 느티나무 씨는 이파리 뒤편에 붙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작은지 이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전우익 지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중
씨앗은 작습니다. 큰 씨앗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씨앗이 크면, 눈에 잘 띄니까 그만큼 쉽게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겠지요.
우주만큼 크고 넓은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도 작디작을 것입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바로 씨앗입니다. 그러니 단번에 눈에 띄지 않는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올해 동안에 마음먹었던 그 수많은 결심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게 심겨 있을 뿐입니다.
채송화
해바라기는 키가 커서
멀리서도 보이지만
키 작아도 채송화
얼마나 예쁜데요
부용꽃은 꽃이 커서
눈에 금방 뜨이지만
꽃 작아도 채송화
얼마나 고운데요
키 작아도 예쁜 꽃
얼마나 많은데요
채송화는 작은 꽃
작아서 더 고운 꽃
- 도종환 지음, <누가 더 놀랐을까> 중
우리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기억과 기대, 모든 감정들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마음속 어딘가에 흩뿌려져 있을것입니다. 키가 큰 해바라기가 아니고, 꽃이 큰 부용꽃도 아니지만, 키가 작고 꽃도 작은 채송화를 더 예쁘고 더욱 곱게 볼 수 있도록 먼저 도종환 시인처럼 낮은 자세를 취해야겠습니다. 보기가 힘들다고, 보기가 싫다고 외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도리어 오랜 정성을 들이고, 온갖 정성을 쏟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라, 주었던 속마음을 조금씩 알아, 준다면. 그동안 버려, 두었던 속마음을 담아, 준다면. 우리 마음에 심긴 씨앗들도 분명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테지요.
자연은 본래 그런 것이니,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대신에 새롭게 먹은 이 마음조차도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자라나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한 해가 저물며 그동안 내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내 감정을 온전히 받아내 표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비슷하게 표현하는 내가 왠지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감싸고 있는 그것들 앞에서 몇 번을 채에 받쳐 내린 마음으로 다가가 아름다운 현을 튕기듯 정성스레 연주하여 어여쁜 화음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해야 한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은 우주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주도 품을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란 게 우주만큼 광대한 크기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나의 마음이건 남의 마음이건, 마음을 안다는 일이 몹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진실도 깨닫습니다. 우직한 농부 전우익 선생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해야 한다고. 아차! 그러고 보니, 그동안 마음을 보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벙덤벙 덤비다 엉망진창 되었던 적이 그래서 많은 것이겠고요. 이제라도 어렵다는 것을 염두하며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농부는 자연에 사는 사람이고, 시인은 자연이 되는 사람입니다. 시인과 농부는 도시에서 자신의 마음을 찾겠다고 자기 자신만 챙기는 도시인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보고 싶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돌보고 싶다면, 먼저 자연을 담으라고. 그리고 자연을 닮으라고
“올 봄에 돌가지 씨를 뿌리며 깨달았습니다. 씨는 작아야 뿌리기도 묻기도 간수하기도 쉽겠다고. 그래서 씨는 이렇게 작게 생겨났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씨가 좀 굵은 율무, 콩, 땅콩은 심어놓으면 짐승들이 파먹기도 하는데, 작은 씨는 짐승들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눈에 띄지않는데 어떻게 건드릴 수 있어요? 낙락장송으로 자라는 솔 씨는 쌀의 오분의 일이 될까 말까하고, 몇 백 년을 살고 아름드리로 크는 느티나무 씨는 이파리 뒤편에 붙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작은지 이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전우익 지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중
씨앗은 작습니다. 큰 씨앗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씨앗이 크면, 눈에 잘 띄니까 그만큼 쉽게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겠지요.
우주만큼 크고 넓은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도 작디작을 것입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바로 씨앗입니다. 그러니 단번에 눈에 띄지 않는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올해 동안에 마음먹었던 그 수많은 결심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게 심겨 있을 뿐입니다.
채송화
해바라기는 키가 커서
멀리서도 보이지만
키 작아도 채송화
얼마나 예쁜데요
부용꽃은 꽃이 커서
눈에 금방 뜨이지만
꽃 작아도 채송화
얼마나 고운데요
키 작아도 예쁜 꽃
얼마나 많은데요
채송화는 작은 꽃
작아서 더 고운 꽃
- 도종환 지음, <누가 더 놀랐을까> 중
우리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기억과 기대, 모든 감정들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마음속 어딘가에 흩뿌려져 있을것입니다. 키가 큰 해바라기가 아니고, 꽃이 큰 부용꽃도 아니지만, 키가 작고 꽃도 작은 채송화를 더 예쁘고 더욱 곱게 볼 수 있도록 먼저 도종환 시인처럼 낮은 자세를 취해야겠습니다. 보기가 힘들다고, 보기가 싫다고 외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도리어 오랜 정성을 들이고, 온갖 정성을 쏟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라, 주었던 속마음을 조금씩 알아, 준다면. 그동안 버려, 두었던 속마음을 담아, 준다면. 우리 마음에 심긴 씨앗들도 분명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테지요.
자연은 본래 그런 것이니,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대신에 새롭게 먹은 이 마음조차도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자라나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한 해가 저물며 그동안 내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내 감정을 온전히 받아내 표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비슷하게 표현하는 내가 왠지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감싸고 있는 그것들 앞에서 몇 번을 채에 받쳐 내린 마음으로 다가가 아름다운 현을 튕기듯 정성스레 연주하여 어여쁜 화음을 이루고 싶습니다.
'SPECIAL > 2011 11-12 오늘, 깨어 있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늘, 깨어 있음 6│감사로 채우는 일주일 (0) | 2011.12.12 |
|---|---|
| 오늘, 깨어 있음 5│깨어 있는 삶을 기록하기 - 선한목자교회의 ‘영성일기’ (0) | 2011.12.05 |
| 오늘, 깨어 있음 3│명랑한 세상을 꿈꾸다 - 아티스트 275c (0) | 2011.11.21 |
| 오늘, 깨어 있음 2│내 속에 살아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지요 - 연극 <빈방 있습니까?>의 덕구, 박재련 장로 (0) | 2011.11.14 |
| 오늘, 깨어 있음 1│그리스도인이여 엎드림으로 깨어나라 (0) | 201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