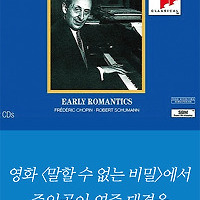대학시절, 레퀴엠을 끼고 살던 한 친구가 있었다. 반지하 방에 기거하며 우울한 진혼곡을 벗 삼아 지내는 그에게 그의 형제들은 음침함에서 벗어나라고, 죽은 자를 위한 노래보다는 산 자를 위한 노래를 들으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모차르트에서 포레로, 다시 브람스로 옮겨가며 레퀴엠에 몰두했다. 레퀴엠은 음습하기보다는 활달하며, 우울하다기보다는 장엄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의 형제들은 죽은 자를 위한 그 곡들에서 그가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긴,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로보카 폴리 장난감을 갖고 놀던 만 네 살짜리 우리 집 아이도 오디오에서 꽝꽝 울려대는 ‘진노의 날(dies irae)’이니 서정적인 ‘눈물과 한탄의 날(lacrimosa)’을 엉터리로 흥얼거리는 걸 보니 레퀴엠이란 것이 침울한 진혼 미사에나 쓰이고 말 비일상적인 음악은 아닌 것 같다. 목소리로 소화해야 하는 성악곡이기 때문일까. 비교적 단순한 선율이 반복, 변주되는 까닭일까. 통상의 교향곡이나 협주곡보다는 귀에 쉽게 감겨오는 맛이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모차르트가 죽기 전까지 작곡에 매달리다가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만 것을 여러 작곡가의 손을 거쳐 제자인 쥐스마이어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곡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곡 전체가 모차르트가 만들어낸 곡은 아니다. 바로크 시대의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키리에(kyrie)’의 2중 푸가나 ‘진노의 날’, ‘두려운 왕(rex tremendae)’ 등에서는 헨델에게서 차용한 대목이 많다. 이런 것이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요즘처럼 저작권을 중요시 하는 시대라면 표절 시비도 붙었음직하다.
하지만 아무러면 어떠랴. 이 곡만큼 모차르트라는 천재성이 드러나는 곡도 없을 듯싶다. 긴장을 고조하며 반음계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는 현음부가 마치 거대한 검처럼 창천 허공을 베어 깊고 긴 틈을 내고 나면 그 사이로 내리비치는 빛처럼 장엄한 합창이 쏟아진다. 졸아든 상상력, 진부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벼락같은 위로다. 겨우 두 번째 곡 ‘키리에’까지 들었을 뿐인데, 일어나 박수를 쳐야 할 것 같다.
C. 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묘사한 것처럼 비루하게 왜곡된 인간의 욕망조차 구원을 얻어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했을 때에 저 하늘에서 자연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노래, 인간 세상에서라면 귀가 감당치 못할 큰 소리로 불리는 그 노래의 편린과도 같은 곡이 아닐까. 레퀴엠에는 조성이 단조인 곡이 많다고? 천상에서는 단조가 없을 거라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영광스런 곡을 작곡한 예술가의 죽음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1791년 12월 5일 새벽, 모차르트는 서른다섯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쓸쓸하게 그려진 것처럼 낭비벽 심한 아내와 궁벽한 말년을 보낸 그의 차가운 주검은 빈 외곽의 스산한 공동묘지 구덩이에 관도 없이 마대자루에 싸인 채 떨어진다.
레퀴엠은 한껏 볼륨을 높이고 들어야 제 맛이다. 다른 이웃은 외출해 있을 토요일 오후가 적당하다. 민원이 제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살짝 일 정도의 볼륨이면 적당하다. 콜린 데이비스 경의 지휘로 듣는 런던 심포니 코러스/합창단의 연주도 좋고, 존 엘리엇 가드너도, 카라얀도 좋다. 50분 간 긴장과 압도당하는 경험과 위로 속에 몸을 내어맡기고 나면, 꽉 찬 오후를 보낸 것 같은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CULTURE > 클래식/국악의 숲을 거닐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백에 흐르는 소리, 구음 시나위│만정 김소희(晩汀 金素姬, 1917~1995), ‘구음(口音)’ (0) | 2013.04.20 |
|---|---|
| 운명처럼 만나 전설이 된 사람들│처칠, 카쉬, 카잘스, 바흐 그리고 우리 (0) | 2013.02.27 |
| 연주 배틀│쇼팽 Etude in G flat major, Op.10 No. 5. (0) | 2012.10.17 |
| 여름밤은 윤이상과 함께│ISANG YUN _ Chamber SymphonyI (0) | 2012.07.25 |
| 오월, 사랑에 물들다│슈만_ 시인의 사랑 Dichterliebe op.48 (0) | 2012.06.20 |